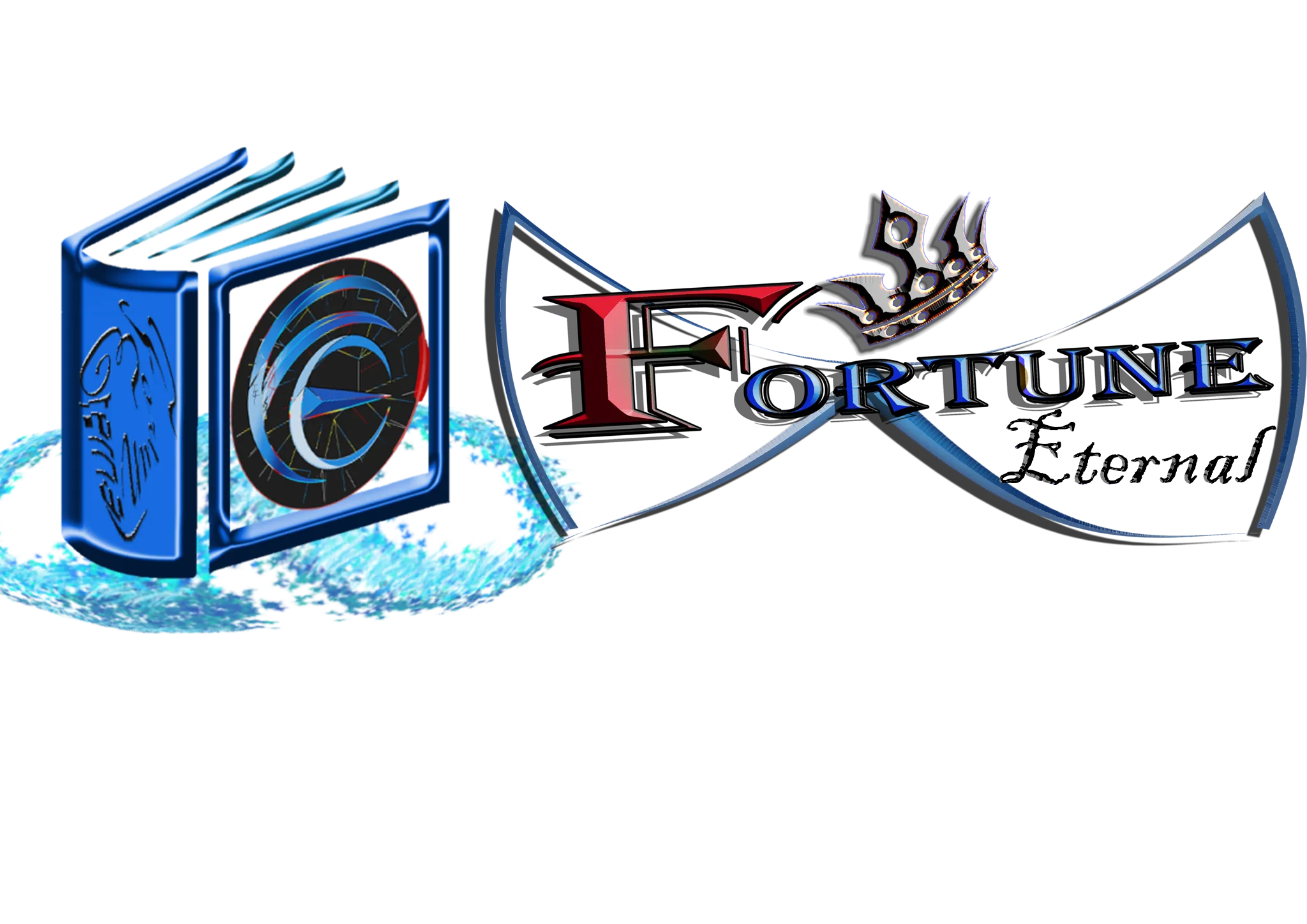The Priest of Corruption RAW novel - Chapter (354)
혼자 손뼉을 치면서.
천천히 걸어온 상투스는 마르낙을 향해 여태 보여온 것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 변명 가득한 그대의 선의에 경의를. 훌륭합니다. 연.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올바른 길을 고르셨군요. 열심히 그대의 귀에 재잘거린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쁩니다.
마르낙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허락된 것은 오직 상투스뿐이었다.
붕대투성이 오른손이 마르낙의 어깨 위를 붙잡았다. 천천히 다가온 붕대투성이 얼굴이 마르낙의 귓가에 대고 자그맣게 속삭였다.
– 선한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이 상투스가 그대의 올바른 선택을 지지하겠습니다. 연. 분분히 나아가십시오.
와아아아아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 싸라기 같은 눈이 떨어진다. 등과 팔을 맹렬히 파고들던 지독한 냉기도 어느새 사라졌다.
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마치 회복이라도 한 듯이.
이내 마르낙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죽었던 이래로 쭉 성장을 멈췄던 권능 중 하나가 진화해있다는 것을.
마르낙은 웃었다. 환히 웃으며 손가락을 뻗어 네마드를 가리켰다.
“너, 떨어지자. 나랑 같이.”
진화한 ‘부패의 구덩이’가 두 사도를 집어삼켰다.
그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남제국 수도 위로 떨어지던 눈이 처음으로 멎었다.
부패의 구덩이.
온통 새카만 공간. 반응할 새도 없이 그저 그자의 손가락이 자신을 가리키는 순간, 네마드는 이미 이 정체불명의 공간 속으로 떨어진 뒤였다.
‘…떨어졌다라.’
이것이 떨어진 것일까? 이 현상이 그자의 표현대로라면 어디론가 떨어진 것이 맞겠지만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은 없었다. 그저 눈 한 번 깜박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을 만큼 짧은 찰나에 이 공간으로 끌려들어 왔을 뿐.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건드린다. 온통 새카만 탓에 어디까지가 이 공간의 끝인지, 어디서부터가 벽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단단한 바닥이 이 공간엔 존재하고 있었다.
‘안 보이는 바닥이 있으니 벽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
만약 그자에게만 이 공간의 벽이 보인다면 근거리 전투로 들어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벽을 이용한 공격을 허용할 수도 있었다. 네마드는 일단 보이지 않는 벽을 어느 정도 경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공간이 더욱 특이한 점은 온통 새카만 탓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빛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네마드는 하나 남은 자신의 손이 멀쩡히 보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혹 이 새카만 공간은 나에게만 이리 보이는 건가? 이 공간의 실제 모습이 따로 있고, 그 시야가 나에게만 차단된 상태라면 벽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겠군.’
그는 잠깐 권능을 발휘해 마르낙이 깨부쉈던 얼음으로 된 왼팔을 재차 만들어냈다.
사고는 길었지만, 네마드가 한 일련의 행동은 찰나 속에서 벌어진 일. 그는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를 끝마치고서 새카만 공간 그 너머를 무심히 쳐다보았다.
한껏 행사하던 권능이 끊어진 느낌.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온 탓에 남제국의 수도 전역에 행사하고 있던 자신의 권능이 무력화되었다. 자신이 없어진 이상, 남제국 수도의 기온은 다시 정상궤도를 향해 조금씩 따뜻해지리라.
그리고 버티고 버틴 끝에 끈질기게 살아남은 남제국민들은 날이 따뜻해지는 대로 벌레처럼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하겠지.
네마드는 자그마한 불쾌감을 밀어내고 마음을 다잡았다. 눈은 그저 자신이 이곳에서 탈출하는 대로 다시 뿌리면 될 뿐이고, 한 번 내려놓았던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데에는 제법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다.
정말 급할 이유 따윈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 중 하나였다. 이 인생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예정이었던 인생이었으니.
탁.
가볍게 발이 닿는 소리. 자신보다 조금 늦게 나타난 그자는 아까까지 입고 있던 갑옷 대신 처음 보는 종류의 새카만 사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언제 다시 주워 왔는지 모를 푸른 검이 쥐어져 있었고.
‘분명 죽기 직전까지 망가뜨려 놓았을 터인데.’
온통 새카만 가운데 하얗게 떠 있는 그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 거의 다 죽어가던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하고 활기가 넘쳤다. 그는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도 안 놀란 얼굴이네? 조금 실망인걸.”
네마드는 무심한 표정을 한 채 답했다.
“꽤나 놀라는 중이다.”
“그게 놀라는 얼굴이라고? 티도 안 나서 별 재미가 없네. 그나저나 너 되게 편해 보인다? 여기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닌…”
마르낙은 깜빡했다는 듯이 자신의 이마를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고는 피식 웃었다.
“안 익숙해서 깜박했네. 이거 이제 들어오자마자 켜지는 게 아니었지.”
딱.